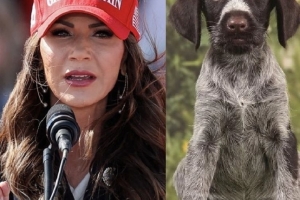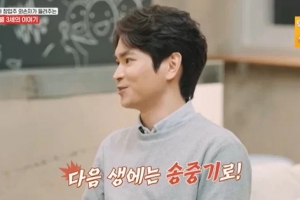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작품상 수상자 명단 봉투가 엉뚱하게도 ´라라랜드´에서 열연한 엠마 스톤의 여우주연상 명단 봉투로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작품상 시상자인 워런 비티와 페이 더너웨이가 잘못 전달받은 봉투는 아카데미의 회계자문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회계사 브라이언 컬리넌이 건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전했다.
PwC도 성명을 내 컬리넌이 “여우주연상 예비용 봉투를 잘못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컬리넌은 불과 몇분 전 무대 뒤에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든 스톤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데 정신이 팔려 파쇄했어야 할 봉투를 비티 등에게 전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컬리넌은 문제의 트위터 사진을 얼마 안 있어 삭제했지만 여러 웹사이트와 구글 등에는 갈무리한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컬리넌과 그의 동료 회계사가 각각 무대 뒤에서 봉투를 하나씩 보관하고 있었다. 스톤과 비티 둘 다 여우주연상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비티가 봉투를 열고 명단을 확인하며 1967년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함께 열연한 더너웨이에게 넘겼고 그녀가 스톤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라라랜드´를 발견해 작품상 수상자로 발표하는 실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BBC는 한발 나아가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 가운데 가장 극적인 해프닝으로 얼룩진 이날의 소동을 통해 다음의 여섯 가지를 알게 됐다고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째는 아카데미위원회가 정말, 정말로 미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모두가 트럼프 반대에 한 몸이 됐다는 것이다.(둘은 뻔한 얘기라 줄인다.)
셋째 아주 특별하게 시상식이 마무리됐지만 시청률은 10년 가까이 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ABC 중계는 미국 내 329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4% 감소했다. 3200만명이 시청한 2008년 이후로 가장 적인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물론 그렇게 하락했다고 해도 아카데미 시상식은 올해도 스포츠가 아닌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의 지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미 키멜은 맷 데이먼과 시상식을 마치고 싶어했다. 둘은 지난해 에미상 시상식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키멜은 28일 자신의 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원래는 데이먼과 함께 시상식을 마치고 싶어 했지만 수상자 명단이 잘못 발표되면서 모든 게 뒤엉켜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맷이 ´무대 매니저가 수상자 발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더군요”라고 “사회자는 무대에 올라가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사회자란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마무리만 빼면 아주 재미있었지요. 미국드라마 ´로스트´ 이후 가장 괴이한 TV 프로그램이 됐어요”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다섯째 더너웨이의 힐 때문일 수도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28일 기사에 따르면 비티와 더너웨이는 작품상 발표를 위해 무대를 나올 때 계단을 걸어내려올 작정이었다. 하지만 더너웨이가 힐 때문에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층계참으로 걸어나와 수상자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신문은 “이 때문에 잘못된 명단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잘못 발표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발을 뺐다.
여섯째 미국 국무부도 트위터 문제가 있었다. 국무부의 페르시아어 공식 트위터 계정은 아스가르 파하디가 연출한 세일즈맨이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수상하자 이란 국민들에게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파하디를 대신해 이란계 미국인 과학자 피루즈 나데리와 아누셰흐 안사리가 수상하며 파하디의 수상 소감을 대신 읽었는데 그는 트럼프의 여행 금지 조치가 “비인간적”이라고 규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정부가 수상 소감에서의 언급을 용인한다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