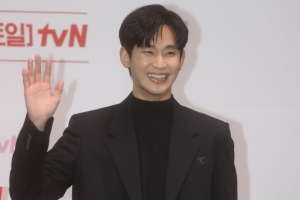반달이 밤을 밝히는 11시, 전남 담양군 창평면 한 주택에 불이 켜졌다. 모두들 하루를 정리할 시각에 38년이 한결같았던 문희연(90) 서울신문 지국장의 하루가 또 시작됐다.
1921년 12월 12일생이니 한 달만 지나면 망백(望百). 손주들 재롱이나 즐길 나이지만 그는 신문 배달을 제외한 지국의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 집 안을 둘러보니 6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다는 살림살이가 깔끔하기 이를 데 없다.
4년 전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아 불면 날아갈 것같은 몸으로 지국 일을 챙기는 그를 4일 오후 7시 30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에서 방영하는 ‘TV 쏙 서울신문’이 만났다. 1973년 10월부터 서울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일해온 그는 어쩌면 현역 신문 지국장 가운데 최고령일 것이다. 서울신문사 독자서비스국 캐비닛에 보관된 지국 계약서는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문 지국장은 띠지를 정리하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4~5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독자들 집 앞까지 몸소 신문을 날랐다.
40분 뒤, 잉크 냄새 자욱한 첫 신문이 차가운 새벽 기운과 함께 배달됐다. 문 지국장은 곧바로 속지를 끼워 넣었다. 젊은 지국장이라면 수십분이면 끝낼 일이지만 그는 대단히 느릿느릿 정성을 다했다. 보고 있자니 외경심이 우러나올 정도.
그 나이에 적지 않은 육체 노동이라니. 그는 “아침마다 일하니까 건강하다. 일하는 재미에다 돈 버는 재미도 있다. 이거 안하면 매우 적적하고, 아플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다섯 남매에 고손자까지 42명의 가족을 뒀다며 자부심을 내비친 그에게 자녀들이 뜯어말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문 지국장은 “난 ‘힘 닿는 데까지 해보련다.’ 그럽니다.”라며 “내 할 일 하는데 너희들이 말린다고 해서 듣겠느냐고 되물으면 얘기가 끝난다.”고 했다.
새벽 2시 40분에 서울신문을 비롯한 두 번째 신문 뭉치가 도착했다. 기사 정정일(44)씨는 “없는 이들 도와주겠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더불어 살자는 정신을 몸소 보여주는 분”이라고 말했다.
문 지국장은 배달될 지역을 정확히 구분해 신문을 쌓고, 또 배달 방법에 따라 부수를 나눴다. 장부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귀가 약간 잘 들리지 않지만 전화로 수금 독촉하고 총무 채근할 정도로 정신은 또렷하다고 했다.
새벽 4시 40분. 광주에서 달려온 총무가 독자들 집 앞이나 학교까지 배달할 신문을 들고 사라지자 그의 아침이 마무리됐다. 한숨 돌린 그가 신문을 펼치는데 한사코 서울신문을 고집했다.
문 지국장이 매일 독자에게 전달하는 신문은 몇 년 전만 해도 850여부였는데 지금은 600부로 줄었다. 신문의 값어치가 나날이 줄어드는 요즘, 38년을 신문과 부대껴온 문 지국장의 신문 사랑에 새삼 눈길이 가는 이유다.
담양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