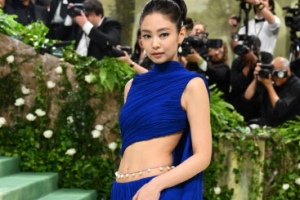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가 끝났다. 롯데가 또 탈락했다. 2연승 뒤 내리 3번 졌다. 팬들의 실망이 쏟아지고 있다. 로이스터 감독의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단기전에 약하다. 우승에는 부적합한 감독이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런걸까. 로이스터 야구는 이게 한계일까.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자.
야구는 일종의 습관이다. 오랜 시간 반복훈련으로 몸 속에 동작을 기입한다. 프로선수쯤 되면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저장된 기억에 따라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대부분 야구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습관에 따라, 감에 따라 움직였다.”고 대답한다. 야구란 게 그렇게 생겨먹었다.
로이스터 감독의 3년은 그 습관을 뜯어고치는 과정이었다. 대표적인 게 몸쪽 승부 강조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대놓고 몸쪽 공을 강요했다. 상대 타자들은 아예 뒤쪽 발을 빼고 타격을 시작했다. 몸쪽에 공이 올 걸 안다는 얘기다. 배터리로선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던져야 한다. 아니면 로이스터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부작용이 잇달았다. 롯데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149개)을 맞았고 3번째로 많은 실점(710점)을 했다. 마운드가 약하다는 게 정설이 됐다. 그러나 반대 수치도 있다. 롯데 투수들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공(1만 9218개)을 던졌다. 가장 적은 볼넷(419개)도 기록했다. 공격적인 투구 패턴의 성과다. 시즌 막판, 롯데 투수들은 몸쪽을 바탕으로 바깥쪽을 적절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MBC스포츠 이효봉 해설위원은 “습관은 말이나 지시로 고쳐지지 않는다. 경기에서 경험해 가면서 바뀐다.”고 했다.
3구 안에 때려야 하는 적극적인 타격 패턴도, 무모해 보이는 공격적 주루도 여전히 시행착오가 끝나지 않았다. 롯데의 강점은 곧 롯데의 불안 요소다. 롯데의 한 선수는 “일단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감독님 질책은 안 받으니 막 뛰고 휘둘렀다. 그런데 실패가 쌓이면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보인다.”고 했다. 선수들은 이제야 로이스터 야구가 몸에 익기 시작했다.
포스트시즌서도 비슷했다. 로이스터는 단점을 메우기보단 장점을 극대화하는 편을 택했다. 단기전에선 세밀한 야구를 해야 한다는 한국 야구의 상식에 도전했다.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 ‘홍대갈’의 난조가 컸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 야구를 제대로 하면 단기전에서도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다. 로이스터의 야구는 이제 시작이다.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야구는 일종의 습관이다. 오랜 시간 반복훈련으로 몸 속에 동작을 기입한다. 프로선수쯤 되면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저장된 기억에 따라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대부분 야구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습관에 따라, 감에 따라 움직였다.”고 대답한다. 야구란 게 그렇게 생겨먹었다.
로이스터 감독의 3년은 그 습관을 뜯어고치는 과정이었다. 대표적인 게 몸쪽 승부 강조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대놓고 몸쪽 공을 강요했다. 상대 타자들은 아예 뒤쪽 발을 빼고 타격을 시작했다. 몸쪽에 공이 올 걸 안다는 얘기다. 배터리로선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던져야 한다. 아니면 로이스터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부작용이 잇달았다. 롯데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149개)을 맞았고 3번째로 많은 실점(710점)을 했다. 마운드가 약하다는 게 정설이 됐다. 그러나 반대 수치도 있다. 롯데 투수들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공(1만 9218개)을 던졌다. 가장 적은 볼넷(419개)도 기록했다. 공격적인 투구 패턴의 성과다. 시즌 막판, 롯데 투수들은 몸쪽을 바탕으로 바깥쪽을 적절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MBC스포츠 이효봉 해설위원은 “습관은 말이나 지시로 고쳐지지 않는다. 경기에서 경험해 가면서 바뀐다.”고 했다.
3구 안에 때려야 하는 적극적인 타격 패턴도, 무모해 보이는 공격적 주루도 여전히 시행착오가 끝나지 않았다. 롯데의 강점은 곧 롯데의 불안 요소다. 롯데의 한 선수는 “일단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감독님 질책은 안 받으니 막 뛰고 휘둘렀다. 그런데 실패가 쌓이면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보인다.”고 했다. 선수들은 이제야 로이스터 야구가 몸에 익기 시작했다.
포스트시즌서도 비슷했다. 로이스터는 단점을 메우기보단 장점을 극대화하는 편을 택했다. 단기전에선 세밀한 야구를 해야 한다는 한국 야구의 상식에 도전했다.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 ‘홍대갈’의 난조가 컸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 야구를 제대로 하면 단기전에서도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다. 로이스터의 야구는 이제 시작이다.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10-10-07 28면